생활공공기관
도구
- 스마트폰,태블릿 화면크기비교
- 양쪽 윈도우키를 한영한자키로(AutoHotKey)
- 매크로: Robotask Lite
- 파일이름변경: ReNamer Lite
- 파일압축: 반디집
- 공공서식 한글(HWP편집가능, 개인비영리)
- 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 텍스트뷰어: 이지뷰어
- PDF: FoxIt리더, ezPDF에디터
- 수학풀이: 울프램 알파 ( WolframAlpha )
- 수치해석: 셈툴, MathFreeOn
-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 이미지: 포토웍스
-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 화면갈무리: 픽픽
- 이미지 편집: Paint.NET, Krita
- 이미지 뷰어: 꿀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KS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 엔팩스(인터넷팩스발송)
- 구글 드라이브(문서도구)
- MS 원드라이브(SkyDrive)
- 네이버 N드라이브
- Box.com (舊 Box.net)
- Dropbox
- 구글 달력
- 모니터/모바일 픽셀 피치 계산
- Intel CPU, 칩셋 정보
- MS윈도우 기본 단축키
- 램디스크
- 초고해상도 관련
- 게임중독
- 표준시각
- 전기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 HWP/한컴오피스 뷰어
- 인터넷 속도측정(한국정보화진흥원)
- IT 용어사전
- 우편번호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변환
- TED 강연(네이버, 한글)
- 플라톤아카데미TV
- 세바시
- 명견만리플러스
-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 과학동아 라이브러리
- 사이언스타임즈
- 과학잡지 표지 설명기사
- 칸아카데미
- KOCW (한국 오픈 코스웨어) 공개강의
- 네이버 SW 자료실
- 네이버 SW자료실, 기업용 Free
- 계산기
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벼 재배면적 조정제 기사를 읽고 본문
유사시 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가 아니라서 밥과 떡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의 섭취열량은 1960~70년대까지는 거의 90%가 곡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단탄지기준이냐 식품기준이냐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1, 과거 거의 9할을 곡물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절반에서 2/3 정도라고 하죠.2 그리고 그 줄어든 비중도 갈라먹어서, 옛날에는 쌀밥을 못 먹어서 분식이었다면 요즘은 쌀이 밀가루에 밀려가고 있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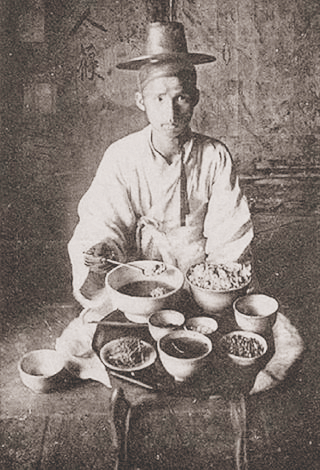
밀가루 대용으로 쌀가루용 쌀을 재배하는 것도 우리밀재배를 하는 것도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가격경쟁력이 너무 없고, 보리쌀은 남아돌아도 소비를 안 해서 매년 곤란하다고 하고..4 5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건데..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5497?sid=101
해결책 없을까… 벼 재배면적 감축 두고 정부-농민 갈등 계속 커져
쌀 소비량이 매년 떨어지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정책이 미봉책일 뿐 문제를 풀
n.news.naver.com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였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가장 적다. 이 수치는 1970년 136.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외식 문화 등이 자리 잡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4년(108.3㎏)의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 기사에서
여담.
저 기사에 언급된 모 정당의원과 농민단체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수입쌀들이겠다고 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우리쌀을 보호하겠다며 늘린 게 그 외국쌀 의무수입량이었죠.
그 의무수입량이 기산단위가 되는 몇 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게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불리한 협상을 한 이유가 바로, 저런 앞뒤 콱 막힌 작자들6때문에 쌀관세화를 일찍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협상당사자들도 계산못하는 바보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시행할 것을 생각못하고, 몇 년만 농민 다독이고 난 다음에 관세화하자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7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늘어져 핸디캡만 무거워졌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의무수입량을 두 배씩 늘려가는 답없는 짓은 여기서 끊자 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관세화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의무수입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인데. 이건 전세계 쌀수출국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다른 당근을 주지 않고 취소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의무수입량을 완전히 없앨 "씽크빅" 제안이 있다면 어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 왜냐 하면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콩도 단백질이 많죠. 우리 조상님들도 호모 사피엔스인데 아무리 땅파서 먹고 살았다해도, 육고기를 적게 먹은 만큼 식물과 수산물에서 단백질을 얻어야 했습니다. [본문으로]
- 어떤 매체는 섭취열량의 65%가 탄수화물인 것은 매우 많이 먹는다고 적어놨던데, 의사들 유튜브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군요. 섭취열량의 2/3는 탄수화물이 맞고, 그 탄수화물을 정제당넣은 식품으로 먹지 말고 소화효소가 제대로 일해서 분해하는 긴 사슬 탄수화물과 잡곡으로 먹고, 나머지 중에서 단백질을 챙겨먹으라는 말로 저는 읽었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하루 섭취열량 2천칼로리 중 65%인 1300칼로리를 탄수화물로 먹고, 나머지 700칼로리 중 400칼로리를 단백질로 먹고, 300칼로리를 지방으로 먹는다면, 단백질은 100그램(영양정보사이트에 따라 조금 다르던데, 닭가슴살기준 400그램 근처?), 지방 33그램 정도죠. 체중 60kg인 사람의 일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그램이니, 60그램입니다. 오히려 지방을 하루 33그램만 먹기가 힘든 게 요즘이 아닐지,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를 너무 먹어서 문제인 것. [본문으로]
- 쌀로 대표되는 곡물생산량이 부족해서, 매년 봄마다 오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밥심이 최고로 받아들여지던 조상님들에게 억지로 혼분식장려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든 습관이 아니라도, 식단의 서구화, 다양화(동양음식도 밀가루쓴 것 많죠. 우리 전통 음식 중에도 밀가루음식이 여럿 있는데, 귀해서 못 썼지 맛없어서 안 쓴 건 아니거든요)로 소득이 올라가며 1인당 쌀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손들이 필연적으로 거치는 변화였을 겁니다. [본문으로]
- 쌀가루용 쌀처럼 보리도 밥용말고 다른 용도로 만드는 건 가능할까요? 음료로는 맥주용 보리 종자를 재배해 순수 한국맥주라고 팔고 수출하기? 서양식 곡물빵용 보리종자도 개발해 건강식에 편승해 사용해보기? 보리밥으로 식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걸쭉하고 맛도 냄새도 쌀식혜하고는 좀 달라서(보리음료 중 최고는 역시 맥콜이 아닐까), 만들어보니 먹기가 쌀보다는 못하더군요. 보리섞은 밥의 위상도, 먹어보면 괜찮은데, 어르신 세대든 요즘 세대든 보리를 콩보다 멀게 생각하는 느낌. [본문으로]
- 아니면 농한기 사료작물재배? 이쪽은 연구기관의 품종정보와, 2010년대 초중반 보도는 보이는데, 최근 몇 년 기준으로 이야기가 검색되는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 "나중에 어떻게 되건 알 바 아니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대로 쌀농사짓게 해줘. 증산하게 해줘/수매해서 수입보장해줘." 그들의 주장을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본문으로]
-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정신으로 자기는 수입반대에 편승해 표심을 사고, 알면서도 문제를 더 키워서 후임자에게 넘겼거나. [본문으로]
'농업, 원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나나 (0) | 2025.01.31 |
|---|---|
| 모과나무 가지치기는 모과를 딴 다음부터 겨울동안?! (0) | 2025.01.31 |
| 설 장보기 메모 (0) | 2025.01.28 |
| 2025.1.26.저녁~: 기상청 대설특보 등: 설 연휴 날씨 (0) | 2025.01.27 |
| 2025.1.24.금~ 2.2.일. 설 연휴 날씨 급변 (낮에도 영하인 강추위): 기상청 일기예보 (0) | 2025.01.24 |
| 요즘 온라인 귤(농산물) 포장 중 하나 (0) | 2025.01.23 |
| 설연휴는 좀 춥겠군요. (0) | 2025.01.22 |
| 한겨울 가로에 살아남은 풀 (0) | 2025.01.20 |
|
Viewed Posts
|
|
Recent Posts
|



